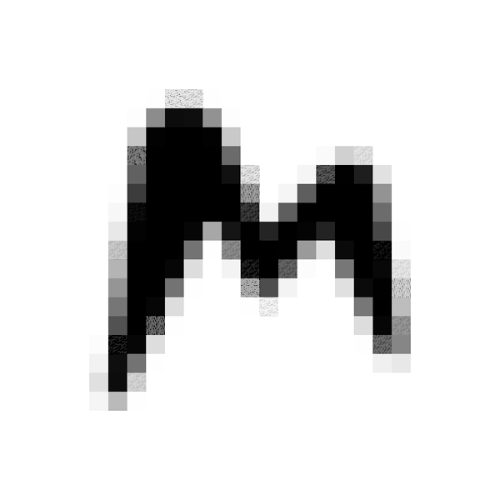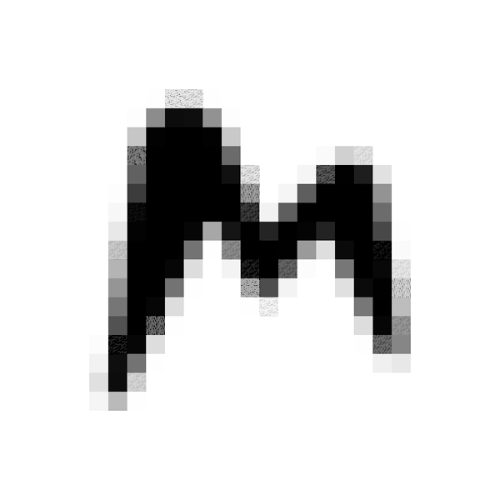지난 20일, JYP에서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했다. 스트레이키즈 이후 약 6년 만에 선보이는 그룹, 넥스지(NEXZ). 넥스지는 멤버 7명 중 6명이 일본인으로, 한국인은 한 명 뿐인 일본 현지화 그룹이다. |
|
|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러한 현지화 그룹을 선보인 것은 니쥬(NiziU)에 이어 넥스지가 두 번째이다. 실제로 넥스지는 제 2의 니쥬라고 불릴 만큼 비슷한 제작 과정을 거쳤다. |
|
|
그렇다면 '니쥬'는 누구인가. 니쥬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일본 최대 음반사인 소니 뮤직이 손잡고 선보인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니지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걸그룹이다. 이 프로젝트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박진영 PD가 기획한 프로젝트이다.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인 트와이스가 K-POP 걸그룹 최초로 도쿄돔에서 3회 연속 공연을 하고 오리콘 차트를 석권하는 등 일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박진영 PD는 일본인으로만 이뤄진 일본판 트와이스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한 목표로 기획된 니지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다. 2020년, 니지 프로젝트 본방송 방영 시즌에는 <명탐정 코난>과 같은 인기 방송을 제치고 주간 차트 1위를 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니쥬가 결성되고 발매한 데뷔곡은 오리콘 차트를 휩쓸었다. 이런 흥행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은 수직으로 상승하였고 시가총액도 1조원에 근접하며 '니쥬'는 JYP에게 있어 말 그대로 복덩이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선례가 생기자, 여러 엔터테인먼트에서 일본 현지화 그룹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하이브의 '앤팀(&TEAM)'과 SM엔터테인먼트의 '엔시티 위시(NCT WISH)', 그리고 앞서 언급한 JYP 엔터테인먼트의 넥스지가 그 예시이다. |
|
|
출처 :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 SM 엔터테인먼트
|
|
|
K-POP 시장을 주름잡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일본 현지화 그룹을 선보이며 경쟁에 열을 올렸다. 니쥬라는 선례를 바탕으로, 이미 아이돌 포화 상태인 한국 시장을 넘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자 한 것이다.
하이브의 앤팀, SM 엔터테인먼트의 엔시티 위시, JYP 엔터테인먼트의 넥스지. 이 세 현지화 그룹의 공통점은 서바이벌을 통해 대중에게 먼저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앤팀은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에 참가했던 4명과 추가 데뷔조 멤버를 뽑는 오디션 <앤오디션 - 더 하울링'(&AUDITION-The Howling)>에 참가한 5명이 멤버로 확정되었다. 엔시티 위시는 데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NCT Universe : LASTART'를 통해, 넥스지 또한 '니지프로젝트'를 통해 데뷔한 그룹이다.
이는 단순히 대중에게 멤버를 노출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아이돌 문화 소비 정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현지화를 위해 이를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본래 아이돌 종주국이었고 그 중심에는 일본 국민 아이돌인 '아라시'를 제작한 '쟈니스'가 있었다. 쟈니스는 오랜 기간 아이돌 업계에 종사하며 일본의 아이돌 소비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쟈니스는 소년들을 연습생 시절부터 육성해 그 과정을 보여주며 팬들을 모으는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이유로 '육성' 개념의 아이돌 소비 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는 있는 일본 시장에서, 연습생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마침내 아이돌로 탄생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익숙하면서도 매번 흥미로운 포맷이자, 멤버 한 명 한 명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었다.
이렇듯 현지화 그룹은 각 국의 문화 양상과 소비 시장의 특색에 맞춰 완벽히 녹아들고 있다. |
|
|
하지만 이렇게 현지화 그룹이 늘어나고 흥행하면서 케이팝 정의에 대한 모호성이 대두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그룹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에서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거나, 한국어가 가사로 쓰이지 않는 등의 다국적 현지화 그룹을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따라붙는 논점이 제시된다. '이건 K-POP이 맞냐'
니쥬를 비롯한 현지화 그룹의 흥행이 증명하는 것은, 이제 K-POP은 국적보다 시스템에 초점을 두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룹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K-POP 시스템을 수출하고 이를 소비하는 개념으로, 현시점에서 K-POP은 비즈니스 모델 혹은 시스템으로 접근되어 정의를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에 서있다.
K-POP을 소비하는 이들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를 정의내리는 방식 역시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기존에 정의되던 K-POP이라는 음악 장르 또한 서양의 팝음악과 일본 J-POP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복합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지금 대두되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은 곧 무의미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수출과 소비가 하나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할지, 순간 빛나는 트렌드가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K-POP이 무궁무진한 변화의 흐름을 겪게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기에 지속가능한 음악적 성과와 문화적 현상으로 이어가고, 혼란이 아닌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
|
90년대 후반 SM엔터테인먼트 소속에 5인조 보이그룹 H.O.T가 해외에서 의미 있는 성공 사례를 남김과 동시에 생긴 용어라 알려진 ‘케이팝’은 2024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활발한 음악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케이팝’은 더 이상 한국 대중음악의 일부로만이 아닌 범지구적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문화이자 산업이며, 필자는 이를 두고 '21세기 멜팅팟(Melting pot)'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본다. 국가 또는 민족 단위로 만들어지고 파생된 고유한 리듬이나 이야기 등이 경계 없이 감각적으로 융화되어 새로운 하나로 탄생하는 모습은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사는 미국과도 엇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케이팝의 정체성을 두고 혼종성, 초국적 보편성이라고도 한다.
케이팝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케이팝의 정체성을 혼종성, 초국적 보편성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더 다양한 논의들도 있으나, 앞선 언급과 반대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존 리(Lie, John)의 경우 케이팝의 정체성을 두고 정체성이 부재하다 피력했다. 정체성의 개념에는 고유성과 본래성이 전제로 깔려있는데,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고유성과 본래성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적 전통문화가 케이팝에는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체성이 없는 케이팝을 두고 "케이팝은 극단적 노동 분업에 의존하는 포장 상품으로, 이 상품은 다양한 전문성을 통합하며 완벽주의로 광이 날 때까지 연마하는 데 큰 가치를 둔다."라고 드러내기도 했다. 즉, 그는 케이팝은 자본 논리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의 말이 온전히 옳은 것은 아니나 근래 들어 케이팝은 정체성과 고유성을 더욱 찾기 어려졌을 뿐 아니라 'K'라는 철자의 존재가 무색할 정도로 의미가 사라졌다.
의도적으로 한국의 전통과 정서를 차용한 게 아니라면, 한국어를 기표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케이팝의 'K' 감각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케이팝은 세계시장 겨냥을 목표로 한국어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케이팝의 'K' 감각은 특정한 요소가 아닌 총체적 경험이라고 정의내릴 수도 있겠다. 케이팝 아티스트의 실력과 언행을 교육하는 시스템, 음악을 더욱 향유하도록 하는 각종 콘텐츠, 팬과의 소통하는 방식 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케이팝의 'K' 감각을 만든다고 말이다. 하지만 '총체적 경험'을 케이팝의 'K'감각이자 정체성이라 말하는 것에는 약간의 억지스러움이 있다. 이는 오히려 정의 내리기 어려운 케이팝을 쉽게 정의해버리기 위한 대안적 방법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케이팝의 'K'의 감각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분명히 차별화된 지점이 있음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불명확한 'K' 감각은 그 자체로의 고유성조차 잃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케이팝이 단지 Made in Korea 딱지가 붙은 콘텐츠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기에 앞서 케이팝의 'K' 감각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
|
|
현재 K-POP 시장에선 국적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K-POP의 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그룹들이 등장했으며, 현지화 전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SM, 하이브, JYP 등 대형 엔터사들은 꾸준히 현지화 그룹을 내놓고 있다. JYP는 현지화 전략은 ‘글로벌라이제이션 바이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요약할 수 있다.
JYP에서는 니쥬, SM에서는 Way V와 nctwish, 하이브는 앤팀을 현지화 그룹으로 데뷔시켰다.
현지화 전략이 가능한 건 K-POP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K-POP 가수가 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K-POP의 K가 붙은 이유는 이들이 연습하고 데뷔, 성장하는 과정에 K팝 시스템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 부분만 봤을 때 K-POP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견들도 볼 수 있다.
이에 반면, K-POP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현지화 아이돌을 데뷔시키는 대형 기획사들은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K-POP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현지화 아이돌처럼 다양한 문화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화들을 우린 꾸준히 지속하고 K-POP을 정의 내리는 방식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현지화 그룹의 사례에 앞서 K-POP의 어떤 문화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본다.
|
|
|
"MHz"
이 웹진의 모든 권리는 웹진 MHz에게 있습니다.
웹진 MHz와 동의 없이 이 웹진에 실린 글을 복제하거나
전산 장치에 저장 및 전파할 수 없습니다.
megahertz1005@gmail.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
|
|
|